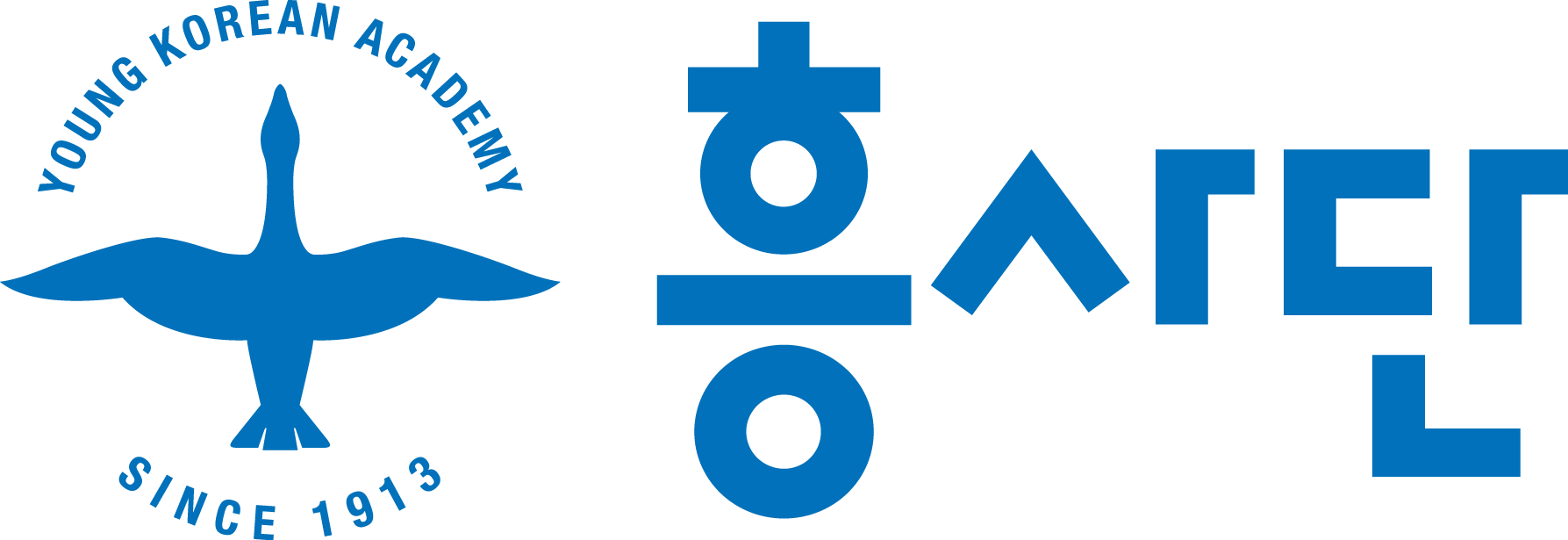Happy Father's Day! - 아버지 시 모음 [정영조 단소관리건축위원회 위원장]
+ 아버지의 등 / (하청호·아동문학가)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 등의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 아버지의 밥그릇 / (안효희·시인, 1958-)
언 발, 이불 속으로 밀어 넣으면
봉분 같은 아버지 밥그릇이 쓰러졌다
늦은 밤 발씻는 아버지 곁에서
부쩍 말라가는 정강이를 보며
나는 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아버지가 아랫목에 앉고서야 이불은 걷히고
사각종이 약을 펴듯 담요의 귀를 폈다
계란부침 한 종지 환한 밥상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밥을 남겼고
우리들이 나눠먹은 그 쌀밥은 달았다
이제 아랫목이 없는 보일러방
홑이불 밑으로 발 밀어 넣으면
아버지, 그때 쓰러진 밥그릇으로
말없이 누워 계신다
+ 희망이네 가정 조사 / (박예분·아동문학가)
우리 아빠는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일자리가 없다.
학교에서 가져온
가정 조사표에 열심히 대답하는 누나.
아버지의 직업은?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임.
아버지의 월수입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예정임.
누나의 눈동자 속에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다.
+ 아버지 / (신현득·아동문학가, 1933-)
고무판을 갈아주랴?
기름을 쳐주랴?
아버지는 기계의 마음을 안다.
아버지가 쓰다듬고
만져주면
콧노래 부르면서 돌아가는 기계
심장이 뛰는 소리
엔진 소리
기계처럼 순한 게 없지.
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
맡은 일을 두고 놀지 않는다.
기계의 숨소리로 가득 찬 공장
아버지도 기계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에 사신다.
비행기도 기선도
아버지가 기계를 달래어 만든다.
+ 아버지 / (이원수·아동문학가, 1911-1981)
어릴 때
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
구경터 어른들 어깨 너머로
환히 들여다보았었지.
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 주셨으니까.
밝고 넓은 길에선
항상 앞장세우고
어둡고 험한 데선
뒤따르게 하셨지.
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속, 품속에 넣고 계셨지.
이젠 나도 자라서
기운 센 아이
아버지를 위해선
앞에도 뒤에도 설 수 있건만
아버지는 멀리 산에만 계시네.
어쩌다 찾아오면
잔디풀, 도라지꽃
주름진 얼굴인 양, 웃는 눈인 양
"너 왔구나?" 하시는 듯
아! 아버지는 정다운 무덤으로
산에만 계시네.
산양 / 이건청
아버지의 등뒤에 벼랑이 보인다. 아니, 아버지는 안 보이고 벼랑만 보인다.
요즘엔 선연히 보인다. 옛날, 나는 아버지가 산인 줄 알았다. 차령산맥이거나
낭림산맥인 줄 알았다. 장대한 능선들 모두가 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었다. 푸른 이끼를 스쳐간 그 산의 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에 닿는 것이
라고, 수평선에 해가 뜨고 하늘도 열리는 것이라고. 그때 나는 뒷짐 지고 아버
지 뒤를 따라갔었다. 아버지가 아들인 내가 밟아야 할 비탈들을 앞장서 가시면
서 당신 몸으로 끌어안아 들이고 있는 걸 몰랐다.
나 이제 늙은 짐승 되어 힘겨운 벼랑에 서서 뒤돌아보니 뒷짐 지고 내 뒤를
따르는 낯익은 얼굴 하나 보인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쫓기고 쫓겨 까마득한
벼랑으로 접어드는 내 뒤에 또 한 마리 산양이 보인다. 겨우겨우 벼랑 하나 발
딛고 선 내 뒤를 따르는 초식 동물 한 마리가 보인다.
아버지의 밥그릇 / 안효희
언 발, 이불 속으로 밀어 넣으면
봉분 같은 아버지 밥그릇이 쓰러졌다
늦은 밤 발씻는 아버지 곁에서
부쩍 말라가는 정강이를 보며
나는 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아버지가 아랫목에 앉고서야 이불은 걷히고
사각종이 약을 펴듯 담요의 귀를 폈다
계란부침 한 종지 환한 밥상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밥을 남겼고
우리들이 나눠먹은 그 쌀밥은 달았다
이제 아랫목이 없는 보일러방
홑이불 밑으로 발 밀어 넣으면
아버지, 그때 쓰러진 밥그릇으로
말없이 누워 계신다
아버지의 나이 / 정호승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등 / 정철훈
만취한 아버지가 자정 넘어
휘적휘적 들어서던 소리
마루바닥에 쿵, 하고
고목 쓰러지던 소리
숨을 죽이다
한참만에 나가보았다
거기 세상을 등지듯 모로 눕힌
아버지의 검은 등짝
아버지는 왜 모든 꿈을 꺼버렸을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검은 등짝은 말이 없고
삼십 년이나 지난 어느날
아버지처럼 휘적휘적 귀가한 나 또한
다 큰 자식들에게
내 서러운 등짝을 들키고 말았다
슬며시 홑청이불을 덮어주고 가는
딸년 땜에 일부러 코를 고는데
바로 그 손길로 내가 아버지를 묻고
나 또한 그렇게 묻힐 것이니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서러운 등짝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검은 등짝은 말이 없다
아버지의 유작 노트 중에서 / 허수경
...여행을 한다, 겨울 속으로 눈은 끝없이 내리고, 새는
후두둑..., 인적의 바퀴는 눈에 쓸려가고 우렁우렁... 雪
山이 대답하는 고요... 나는 발견한다... 대숲...,
너무 좋아서, 맨발의 아가처럼
연록의 저 천진, 천진은 애리다
...며칠을 서성인다, 들어가보지 못하고, 저 숲의 속은 자
궁처럼 고요하리라 탯줄처럼, 황홀의 타원 쭈글쭈글한 주름
벽의 황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은 가져서는 안 된다, 인
적의 바퀴처럼 지나온 것들은 마땅히 묻을 것을 묻어준
다...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의 일생이었도다...
그러나 끝내 비틈한 어깨여
쓰러지고 싶지는 않았으나 끝내 쓰러지리라
...쓰러진 위에... 위에 발자국을 지우며 하얀 녹음 밑
의 시커면 개골창...
나의 돌아감을 나여 허락하라
나는 나에게밖에 허락을 간구할 때가 없나니
아버지의 등을 밀며 / 손택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엘 가지 않았다
여덟 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엘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다섯 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번은 입 속에 준비해 둔 다섯 살 대신
일곱 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 지면 달 지고, 달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업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 김동호
사진첩 속 사진이 퇴색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기억이 있다.
六.二五 전쟁, 一四후퇴때
빙판길 미끄러지며 미끄러지며
찾아간 첫 피난 마을
피난간 빈집, 안방 차지하고
쌀독이며 김치독이며 마구 허는 재미에
전쟁도 잠시 잊은 듯 마냥 흥겹기까지 한 피난민들
그 속에 우리도 끼여서 하룻밤을 잤지
그러나 누가 알었으랴
이튿날 아침 ,우리 소 우리 소가 없어진 것을,
우리 여섯 식구의 전재산을 실은 우리 소
놀란 아버지 찾아나섰지만
소는 이미 어떤 집 마당
큰 가마솥에서 끓고 있고
소의 머리통, 버젖이 전승물처럼 걸어놓고
무법천지 음미하고 있는 그들
“이 소 ,우리 소요”
채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대 여섯 장정 우루루 몰려나와
“무슨 개수작이냐”며
소주인도 소처럼 요절낼 듯한
아-그 험한 얼굴들
나는 그 때 보았다.
아버지의 하얗게 질린 얼굴
하얗다 못해 파아래진 안색
그 안색은 그 후에 회복이 되지 않았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 하시고
자조 자조 깨시던 아버지
의사들은 주사바늘 꽂으며
“신장염입니다. 만성 신장염입니다.”
꽤나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들은 모른다.
그 후 십년 동안 곯다가 곯다가 가신
우리 아버지의 정말 병명을
그들은 모른다.